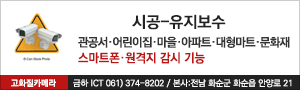|
들여다보았다. ‘슬릿스코프’와 ‘카카오브레인’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이다. 글귀를 주면 이어서 시를 써주는 인공지능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어 기반 언어 모델인 '코 지피티( koGPT)'로 만 삼천 편의 시를 학습시켰다고 했다.
'시아'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서 쓰지는 못한다. 시제를 정해주어야 한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야무져 가는 듯하다.
시간의 위의 길, 구름에 깃든 달, 노년의 발자국 등의 시제가 보였다. 많다고도 적다고도 할 수 없는 시제들이었다.
'시인이 머문 자리'를 선택했다. 쉽게 줄줄 잘도 써 내려간다. 질투심 비슷한 게 느껴진다. 어느 곳쯤에서 멈춘다. 두 개의 구절을 놓고 고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조금 괜찮다 여겨졌다. 결과야 뻔하지만 나도 시 쓰기에 참여한 듯한 착각에 빠진다.
시를 받아 들었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이걸 시라고 할 수 있을까. '시아'의 생각이 얼마만큼 담겼을까. 단지 언어의 유희는 아닐까. 마치 만 삼천 권의 책을 읽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갖추지 못하는 우둔한 독서가처럼.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만약 학습된 시어의 조합이라면 어구 하나하나에 출처를 알리는 각주를 달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더 이상 시라고 부르기 무색하다.
의문은 계속되었다. 이 시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시아인가. 만 삼천 편의 시를 제공한 시인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인가. 나도 한몫했으니 일부를 주장할 수 있을까.
나는 시를 모른다. 다만 시인은 가슴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시아’는 가슴이 있을까. 모를 일이다. 다만 확실하게 이것만은 말 할 수 있다. 삭막하다. 소름도 돋는다. 시인 장석주는 그의 책 <은유의 힘>에서 “오늘날 시인은 멸종될 위기의 생물종으로 대접받는다. 시인이 멸종하면 시는 사라진다.”라고 했다. 시인이 사라지는 시대를 대비한다면 ‘시아’가 고맙다.
머리가 복잡하다. 기계가 이제는 감성의 영역까지 넘본다. 내 의지 따위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저만큼 흘러간다. 뜬금없이 '시아' 동생이 찾아와서 내 글을 대신 써주겠다고 하지는 않을른지... .
설 연휴가 끝나자 새벽부터 눈이 내린다. 정초(正初)의 눈을 상서롭다고 했다. 창 넓은 카페에 앉아 눈을 구경하며, 커피를 마시며, 글도 쓴다. ‘시아’에 비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달콤한 휴식이 끝나고 이제부터 다시 일상이다. 세상과만 경쟁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과도 겨루어야 할지 모르겠다.
서설(瑞雪)과 함께 시작하는 출발이다.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다. 구독자님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사설칼럼 많이 본 기사
|